Inspired #20 | Claude Code, AI가 뇌를 망가뜨리는 이유, 질문이 해자, AI 네이티브 직원, DHH, 차별화와 Taste 등
근황
5월 이후로 거의 3개월간 글을 거의 안 썼다.
외부에 글을 쓰거나 네트워킹 같은 것에 시간을 쓰는게 기술을 파고들고 제품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나만의 시간에 몰입 중이었다. 깊이 있는 공부랑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누굴 만나도 새롭게 자극을 주고받을 만한 양질의 인풋이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도 있다. 누굴 만나면 상대방의 시간이 아까울 것 같은 기분.
그러다보니 외부의 소통을 엄청나게 줄이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의 에너지는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1주일 정도 밖에 안나간 적도 많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인 듯. 혼자만의 시간에 쌓인 내공이 나중에 진짜 기회를 잡을 때 큰 힘이 된다는 걸 점점 더 느끼고 있다.
필요할 때 다시 연결될 용기를 내면 되고, 지금은 내 페이스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준비하는 시간도 결국 운을 만드는 과정 중 하나니까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예전에 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대단한 결과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제품을 만들고 파고들면서 새롭게 깨달은 걸 더 자주 글로 남기려 한다. 그냥 Substack이 나에겐 딱 최소한의 외부 불특정다수와의 소통 창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그래도 놓지 않으려고 한다.
ㅤ
그리고… Claude Code가 진짜 미쳤다
최근 한 달은 Claude Code Max 20X ($200)를 결제해서 미친듯이 코딩을 직접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운 점이 엄청 많다.
일단 확실한건 생산성이 20X가 아니라 수백배 좋아졌다고 느끼는 중이다. Cursor는 일단 버린지 오래됐다.
조만간 유저들이 space-zero 안에서 자유롭게 텍스쳐를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직접 AI PBR Generator를 만든 과정을 "How I built AI PBR Generator with Claude Code in 2 days" 라는 제목으로 실제 경험 + 배움을 정리해서 글로 써볼 예정! Claude Code 꿀팁 대방출 할 거다 (나만 알고 싶은건 숨길지도 ㅋㅋ)
참고로 나는 Claude Code 전까지 진짜 간단한 UI + CRUD 구조를 가진 웹사이트나 간단한 셰이더 정도만 다뤄봤다.
그래서 나 정도의 개발 지식으로도 아래 결과물들을 해냈다는게, Claude Code가 얼마나 대단한건지 알 수 있다.
기존 거대 repository에서 admin 부분만 별도의 repository로 분리
PBR (Physically Based Rendering) Map의 Albedo는 Stable Diffusion의 ControlNet으로 작업
Albedo를 활용하여 나머지 Map을 생성하는 것은 별도의 Repository를 파서 Railway에 호스팅 후 API 서비스화 (MSA 아키텍쳐)
Albedo 생성 → API 호출 → Sharp 모듈 + 프롬프트 활용하여 나머지 Map 생성 후 반환 → PBR Map Set 완성
위 과정을 Upstash workflow를 활용하여 관리
Displacement Map을 통해 지오메트리 변환
아래는 실제 작동 영상 (마지막에 결과물)
아무튼 이걸 통해서
100원 이하로 PBR Map Set을 만들 수 있게됨. 원래는 이걸 위해 Adobe Substance 3D Painter를 다룰 줄 아는 전문 디자이너를 고용하거나, 만들어진 유료 PBR Set을 세트당 보통 저렴한게 400원 이상을 주고 구매해야하는 것인데,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저에게 이 기능을 풀어서 Texture의 종류가 미친듯이 많아질 수 있게 될 거라는 점!'
아마 몇 주 내로 총 정리해서 글로 올리지 않을지..
ㅤ
아래부턴 그동안 인상 깊게 읽은 것들을 분류해서 정리한 것들이다.
1) AI
1.1) Reshuffling
When AI Has Better Taste Than You
AI가 인간의 능력, 취향, 심지어 의지까지 따라잡는다면 인간의 역할은 뭘까? 이 질문이 최근부터 머릿속을 계속 맴돈다.
이제는 AI가 코딩, 글쓰기, 음악, 그림까지 사람보다 잘한다. 취향조차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정교하게 모방한다면, 남는 건 결국 ‘의지’뿐일까? 그런데 그 의지마저 내가 프로그래밍한 AI가 흉내낸다면?
결국 인간의 역할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맥락과 가치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 아닐까 싶다. AI는 데이터와 목표가 주어져야 움직이지만, 인간은 문제 자체를 새로 정의하고, 목적을 창조할 수 있다.
AI가 아직 모르는 현장감, 직접 발굴한 새로운 경험, 데이터로 존재하지 않는 감정과 맥락. 이런 것들이야말로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이걸 왜 해야 하지?”,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뭘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힘,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용기, 그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다.
AI와 동등하게 협력하려면, 정답을 내는 능력보다 질문을 새롭게 던지는 힘, 새로운 데이터와 맥락을 직접 만들어내는 경험, 그리고 ‘왜’라는 본질적 동기를 탐구하는 태도를 더 갈고닦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새로울 수록 AI에게도 새로울테니, 그게 곧 경쟁력일지도.
ㅤ
Technical Shift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처음엔 컴퓨터가 기업, 정부, 연구소에서만 쓰이던 시절이 있었음.
PC랑 GUI 나오고 나서야 일반 사람들도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됨.
그 이후로 워드프로세서, 게임, 인터넷 등 개인이 뭔가 만들고 소비하는 게 폭발적으로 늘어남.
인터넷
인터넷도 원래는 군사, 학술 네트워크(B2B)에서 시작.
웹 브라우저, 이메일, 검색엔진, 블로그, 소셜미디어 같은 게 나오면서 B2C로 확장.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을 쓰는 시대.
스마트폰과 모바일 앱
초창기 모바일 기기는 비즈니스맨들이 이메일, 일정관리용으로만 썼음.
아이폰,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등장하고 나서 게임, SNS, 쇼핑 등 B2C 시장이 확장됨.
지금은 스마트폰 없는 사람 찾기 힘듦.
클라우드·SaaS
클라우드랑 SaaS도 처음엔 기업들이 IT 비용 줄이려고, 협업하려고 썼음.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노션, 에버노트 등 나오면서 개인도 쉽게 쓰게 됨.
이게 반복되는 이유는
처음엔 기술이 어렵고 비싸서 기업 위주로 도입되고,
점점 쉬워지고 싸지면서
결국 일반 소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기 때문.
AI도 똑같은 길 걷고 있다고 본다. 지금은 생산성, 자동화, B2B에 집중돼 있지만 점점 더 쉬워지고, 개인화되고, 싸지면서 누구나 자기 니즈에 딱 맞는 AI 도구랑 컨텐츠 직접 만들고, 직접 소비하는 B2C 시대로 넘어갈 가능성 높음.
ㅤ
What people are vibe coding (and actually using)
나도 요즘 Claude Code랑 바이브코딩 빡세게 하면서, 오히려 진짜 코딩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다. 예전엔 무작정 문서만 읽고 따라했다면, 이제는 아예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직접 정의하고, 가설 세우고, 일단 만들어보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파고들고, 되면 내 가설이 맞았다는 걸 체감하면서 배우는 느낌이 훨씬 크다. 인지력을 진짜 많이 쓴다.
또한 Claude Code 때문에 사고의 마찰이 확 줄어든다. 예전 같으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작도 못할 거를,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걸 자연어로 설명하고, 바로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써보고, 필요하면 계속 수정할 수 있다. 덕분에 내가 갖고 있는 엄청 디테일한, 남들은 신경도 안 쓸 문제를 딱 해결하는 버티컬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ㅤ
Most people still don’t know how to use AI.'
디자이너에게 찾아온 평생 한 번의 기회라는 말이 너무 공감된다. 구현의 비용은 낮아지고 있고, 훌륭한 감각, 취향, 아이디어, 실행력을 가진 디자이너에겐 너무 좋은 상황임.
이제 우리는 화면이 아니라 ‘지능’을 설계해야 한다
→ 최근 들어 Agent, RAG, AI SaaS 등 여러 AI 컨셉의 도구나 워크플로우를 직접 만들면서 느낀 점 그대로다. 로직을 어떻게 똑똑하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생산성/UX의 개선 기울기가 미친듯이 가파르게 변한다. 매주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에 모델이 가진 지능을 미친듯이 극대화하고 레버리지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빠르게 발견하고 워크플로우와 제품에 적용해야한다. 속도가 생명이다.Claude Code 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는 감각있는 디자이너 분들이랑 친해지고 싶다. 내가 엄청 잘 알려줄 수 있고 그럼 잠재력 폭발할텐데
ㅤ
1.2) How to use AI smarter (and how not to get dumb yourself)
챗GPT 이렇게 쓰면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MIT Media Lab의 EEG 기반 연구 세 그룹(AI 이용 글쓰기, 구글 검색 후 글쓰기, 완전 자필) 비교 결과,
AI로 에세이를 작성한 참가자의 전뇌 네트워크 연결성이 40–50% 급감
이후 본인이 쓴 글 내용을 재소환할 때 오류율 83% 기록
몇 달 뒤 AI 없이 다시 글을 쓰게 해도 성능 회복이 미미(지속적 저하)
이는 “AI 사용 → 뇌 자원 덜 사용 → 기능 회복 불가” 가능성을 최초로 실증한 사례라고 함. 문제 정의, 가설 설정, 비교 및 평가, 기억재구성과 같은 고차원적 인지 과정을 의식하여 하지 않으면 뇌는 퇴화한다.
그래서 내가 최근 내린 결론은 AI는 증폭기라는 점이다.
내 뇌의 역량이 10이고 AI의 증폭배수가 2면 10 * 2 = 20이라는 지적 능력을 얻는 것이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AI에 과도하게 많은 것을 "해줘" 하다보면 내 뇌 역량이 줄고, 결국 총 증폭량도 우하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AI가 너무 똑똑해져서 증폭배수가 미친듯이 높아지면, 인간의 뇌 역량이 지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인간 뇌의 독립적 사고력과 자주성은 인간으로써 행복한 삶에 의미가 있는게 아닐지..
ㅤ
인지적 오프로딩
인지적 오프로딩은 AI와 함께 생각하기보다 AI에게 생각 자체를 위임하는 것. 물론 더 빠르고 편하지만, 그 대가로 비판적 사고력과 AI 활용 잠재력을 잃게 된다.
스스로가 오프로딩에 빠졌는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자주 AI의 답변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가?
AI의 답을 얼마나 자주 의심하고 신뢰할 만한 출처와 교차 검증하는가?
AI가 제시한 해결책과 결정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가?
대답이 “거의 안 함”, “잘 못 함” 쪽이라면 AI에 사고를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속적으로 오프로딩을 하면,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AI가 틀렸을 때 이를 포착하기 어려워진다.
ㅤ
인간이 진짜 ‘경험’해야 하는 이유 [이달의 베스트북: 경험의 멸종]
영상과 댓글의 내용이 인상 깊게 남아서 공유하고 싶다.
ㅤ
AI Can Fix Social Media’s Original Sin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 얘기 나올 때마다 결국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광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려고만 하고, 그러다 보니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콘텐츠만 계속 추천된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플랫폼의 수익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더 정교한 ‘케이크’만 계속 내놓는 셈. 진짜 변화는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플랫폼의 책임감까지 같이 바뀔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ㅤ
1.3) Rewriting the Rules of Work
The rise of the AI-native employee
AI 네이티브 직원 → AI를 자연스럽게 활용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게 실행하는 사람을 뜻함. 단순히 “AI 툴 써봤다”가 아니라, 일의 시작점이 AI고 뭔가 필요하면 먼저 AI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승인, 회의, 복잡한 절차 없이 직접 만들고 실패해도 금방 다시 도전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 관료주의나 쓸데없는 프로세스는 딱 질색이고, 효율과 결과에 집중한다. 새로운 AI 도구는 바로 써보고, 동료와 신뢰 기반으로 수평적으로 일하는 걸 선호한다.
ㅤ
An AI "Metamorphosis": Transforming into an AI-native company.
AI 네이티브 회사는 단순히 AI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가 AI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
모든 직원이 SQL 같은 기본 코딩을 할 수 있게 되면, 개발자와 비개발자의 경계가 무너짐
CTO 역할도 바뀐다. 이제는 직접 일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누구나 쓸 수 있는 안전한 개발 환경(프리미티브)을 만들어주는 플랫폼 빌더가 됨
가장 큰 장벽은 기술이 아니라, “나는 못 해”라는 심리적 한계. 이걸 깨는 게 핵심
조직 전체가 AI를 이해하고, 직접 써보면서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져야 진짜 AI 네이티브 회사가 될 수 있음
ㅤ
Every를 AI native 조직으로 운영하는 법
다른 팀은 어떻게 하는지 참고하기 좋은 영상!
ㅤ
Why AI Labs Are Starting to Look Like Sports Teams
AI 업계가 점점 스포츠팀처럼 변하고 있다. 예전엔 Compute(연산 자원) 확보가 핵심 이슈였는데, 이제는 ‘인재’가 완전히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는 중. 대형 테크 회사들이 스타 연구자들을 영입하기 위해 수십억~수천억 단위의 보상 패키지를 만드는 중. 특히 구글, 메타 같은 회사들은 공격적으로 인재를 영입하고, 조직 구조도 빠르게 바꾸고 있다.
ㅤ
Tech Philosophy and AI Opportunity
AI가 세상을 풍요롭게 만든다고들 하지만, 실제로 돈이 몰리는 곳은 희소성이다. GPU는 여전히 부족하고 AI 인재들은 프로 운동선수보다 연봉을 더 받는다. 예전엔 구글, 아마존, 메타, MS, 애플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놀았다면, 이제는 모두가 같은 AI 게임을 하고 있어서 인재 몸값이 미친듯이 뛰는 중
애플이 AI 인재를 메타에 뺏긴 게 화제가 됐지만, 애플은 원래 GPU 구매도 보수적으로 하고, AI에 큰돈 쓰는 걸 망설이는 중. 이유는 단기적으로 AI가 애플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회사 철학 자체가 ‘도구로서의 컴퓨터’에 가깝기 때문. 즉, AI가 인간을 대체하기보단 인간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보조 역할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 그래서 AI 앱이 아이폰에서 잘 돌아가면 됐지, 직접 모델을 키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다.
반면, Meta는 ‘컴퓨터가 인간 대신 일해주는’ 세상에 더 가까운 쪽이다. 공격적으로 인재를 영입하고, AI에 올인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구글도 AI에 집착적으로 투자하지만, 검색 광고라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AI가 충돌하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물론 최근 광고 매출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얘기도 공존한다)
MS는 ‘코파일럿’ 같은 생산성 도구형 AI에 집중하고, 하지만 직원들이 실제로 새로운 도구를 쓰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Anthropic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에이전트형 AI에 집중해서, 기업 생산성 극대화와 비용 절감을 노린다. 그리고 실제로 워킹하고 있고.
ㅤ
2) Playbook for builders
2.1) Mindset
DHH: Future of Programming, AI, Ruby on Rails, Productivity & Parenting | Lex Fridman Podcast #474
루비온레일스 창시자
Basecamp / Hey email 창업자
Rework 저자
Le Mans 24 클래스 우승 드라이버
루비온레일스도 알고, 베이스켐프랑 헤이 메일도 알고, Rework도 읽었지만 그게 같은 사람이라는걸 이제 알았다 ㅋㅋㅋ 심지어 레이서라니
아래는 DHH의 철학
복잡함에 맞서는 단순함, 그리고 인간 중심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정말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그걸 쓰는 사람의 경험이라는 점. Rails의 ‘프로그래머 행복 최우선’ 철학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코드와 조직 문화, 비즈니스 의사결정까지 관통하고 있다는 게 인상적
“최대한 단순하게, 하지만 생산성과 미학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태도. 예를 들어, PHP 시절의 즉시성(코드 쓰고 바로 배포)에서 얻었던 짜릿함을 Rails 8 ‘No-Build’로 다시 구현하려는 집요함
“복잡성 상인들”이라는 표현. 뭔가를 더 그럴듯하게 만들려다 오히려 본질을 잃는 개발 문화에 대한 비판
작은 팀, 최소한의 매니지먼트, 회의 없는 환경이 진짜 혁신과 몰입을 만든다는 주장. Basecamp, HEY 같은 제품도 결국 ‘작은 팀이 만든 단단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성과가 존재하므로 매우 설득력 있음. AI로 인해 개개인의 잠재력이 극대화되는 환경일수록 이런 철학이 더 적합해지지 않을지?
행복은 ‘몰입할 수 있는 문제, 성장의 여지, 적당한 긴장감’에서 온다
ㅤ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진실에 관심이 없는 이유?
진실은 느리다. 스토리는 빠르다. 빠른 스토리에 휩쓸리면 편하고 재밌다.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진짜인지 잘 안 보인다. 진실을 파고드는 건 솔직히 귀찮고 오래 걸린다. 그래도 결국 남는 건 그 느린 탐구에서 얻은 확실한 무언가다. 결론은, 당장은 스토리가 더 끌리지만, 진짜 중요한 건 느려도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ㅤ
Good Writing
좋은 글은 논리와 문장 구조, 이 두 가지에서 완성도가 갈린다.
논리는 글의 뼈대다. 생각이 명확해야 하고, 주장과 근거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 읽는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을 때, 글 안에서 이미 답이 나와야 한다.
여기에 부드럽고 말끔한 문장 구조가 더해지면 읽으면서 막히는 부분 없이 자연스럽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간다. 불필요하게 복잡한 표현은 줄이고 리듬감 있게 다듬어야 한다.
논리만 있으면 딱딱하고, 문장만 부드러우면 내용이 비어 보인다. 결국 잘 쓴 글은 논리와 문장 구조가 서로를 밀어주면서 완성된다.
ㅤ
Life is Lived in The Arena
이론, 수학, 논리. 다 멋진 도구지만, 현실에서는 얘기가 좀 다르다. 머리로만 아는 건 한계가 있다. 결국엔 직접 부딪혀봐야 진짜 배운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아, 이럴 때 이 원칙을 쓰면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논리적 사고로 시작하더라도,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감각이 생긴다. 책에서 읽은 지식은 쉽지만, 그걸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써먹을지는 오직 경험이 알려준다.
ㅤ
2.2) 차별화
The Great Differentiation
핵심 7가지 번역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경험: 남들이 흉내 낼 수 없는 실제 경험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현장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이벤트를 여는 것처럼요.
진짜 결과물: 단순히 멋진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 남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조각상, 실제 기술, 실제 서비스 등 남들이 쉽게 복제할 수 없는 ‘진짜’를 보여주는 겁니다.
창업자만의 배경과 스토리: 자신의 성장 배경, 가치관, 경험을 브랜드와 제품에 녹여내세요. 남들이 따라 하려 해도 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문화, 취향: 자신만의 문화적 뿌리, 취향, 역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면, 그 자체가 차별화가 됩니다. Stripe의 아일랜드 펍처럼요.
시간, 돈, 노력이 들어가는 것에 투자: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투자하세요. 시간과 자원을 들여야만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은 남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없습니다
왜, 어떻게, 본질을 차별화. 남 따라하기 X: 단순히 겉모습을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왜’ 이걸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본질에서 차별화해야 합니다. 남을 따라 하면 결국 평범해집니다.
계속해서 변화, 남들이 따라하면 또 다시 변화. 끝없는 변화: 한 번 차별화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남들이 따라오면, 또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차별화는 멈추지 않는 과정입니다.
ㅤ
Taste Is the New Intelligence
뭘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뭘 어떻게 고르고 받아들이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AI가 평범한 퀄리티의 컨텐츠를 인터넷에 뿌리고 있다. 좋은 인풋을 잘 선별해서 섭취하는 것도 의지를 가지고 관리해야한다.
취향과 분별력이 결국 내가 뭘 만들고, 어떤 선택을 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뉴스, 트렌드, 남들이 뭐라 하든 일단 내 기준으로 거르고 “이거 진짜 내 삶에 중요할까?” 한 번 더 생각해봐야함
좋은 인풋이 쌓이면 내가 뭘 할지 고민할 때도 훨씬 수월해진다. 불필요한 거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ㅤ
Own the Demand
인터넷 기업의 전략적 위치는 ‘수요(고객 접점)’를 얼마나 직접 소유하느냐에 달려 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은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지 않고, 브라우저(Chrome), OS(Android, Chrome OS), 하드웨어(Chromebook), 인터넷망(Google Fiber) 등 고객과의 모든 접점을 직접 만들려고 한다.
그 이유는 고객과 기업 사이에 다른 플레이어(예: 애플, 통신사, 브라우저 회사 등)가 끼어들면, 기업이 고객 경험을 통제하지 못하고, 수익도 빼앗길 수 있기 때문
실제로 애플이 iOS에서 광고 추적을 제한하자, 페이스북의 핵심 비즈니스가 큰 타격을 받았다. 과거 페이스북이 외부 게임사(징가)나 트위터가 서드파티 앱을 차단한 사례도 존재
이런 맥락에서, ‘수요를 소유하는 것’이 공급을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예를 들어, 브뤼셀 스프라우트(양배추) 공급을 모두 소유하는 것보다, 그 채소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소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위험도 적다.
플랫폼 기업들은 자산이나 재고 없이 수요를 모아 공급을 끌어들이는 구조다.
예시: 우버(차량 없음), 에어비앤비(부동산 없음), 페이스북(콘텐츠 없음), 이베이/알리바바(재고 없음).
수요를 소유하면, 공급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즉, ‘더 나은 쥐덫’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지만, 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면, 공급자들이 알아서 찾아온다.
이 원리는 이커머스, SNS, 검색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구글과 페이스북은 재고나 물류 없이도, 광고를 통해 이커머스 시장의 큰 이익을 가져간다.
카일리 제너는 마케팅(수요)만 직접 관리하고, 제조·포장·배송·회계 등은 모두 외주로 돌려 초경량 구조로 9억 달러 규모의 화장품 회사를 만들었다.
애플은 검색엔진 없이도, 구글로부터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팔아 연 9~12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Bing 전체 매출보다 많다.
ㅤ
Tails, You Win
long tail, 수많은 시도 중에 하나가 성공해서 모든걸 상쇄하고도 미친듯이 남을 만큼 커다란 성장, 영향력, 성공 그 무엇이든 가능케 하는 현상.
long tail을 만드는 것의 본질은 뭘까? 정말 수많은 시도 그 하나뿐일까? 더 중요한게 있지 않을까? 단순히 많이 시도한다고 long tail을 만들지는 못한다.
내 생각엔 그걸 long 하게 만드는 어떤 원칙이나 특성이 있을거라고 본다.
그건 아마도 배움의 복리이지 않을지? 시도로 인해 나오는 output은 항상 있다. 그걸 다듬어서 outcome으로 만들고, 그 outcome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배움일 거다. 배움이 중요한 이유는 실패에서도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음이고, 그건 다음 시도를 더 낫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ㅤ
The Next Generation of Software | Mamoon Hamid, Partner at Kleiner Perkins
세상을 바꾸는 소프트웨어와 회사를 만들고 싶다면, 변화의 흐름을 읽고, 타이밍을 잡고, 집요한 창업자와 함께 깊이 있게 실행하는 것이 본질
ㅤ
2.3) 만드는 행위
EP 60. 이제 질문이 병목이다: Right Questions are All You Need
질문이 해자인 이유는 3가지다.
컨텍스트 의존성
질문은 항상 특정 시점, 맥락,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다. 산출물만 복제하면 그 순간의 ‘정지 화면’만 얻을 뿐, 질문을 가진 사람만이 변화하는 맥락에 맞춰 계속해서 ‘업데이트 루프’를 돌릴 수 있다.
파생 학습과 적응 속도
좋은 질문 세트는 새로운 실험, 파인튜닝, RAG의 재료가 된다. 질문을 가진 쪽은 더 빠르게 실험을 반복하며 학습 곡선을 가파르게 올릴 수 있지만, 복제자는 어떤 질문으로 다음 단계를 가야 할지 알 수 없다.
검증과 품질 메트릭의 비가시성
사람이나 AI가 내부적으로 매긴 산출물에 대한 점수나 우선순위 체계는 외부에서는 알 수 없다. 산출물만 보고는 그 뒤에 어떤 기준과 과정이 있었는지 복제할 수 없고, 시간이 갈수록 질문-평가 파이프라인은 그 조직만의 ‘AI 근육’이 된다.
결국 본질은 누가 더 좋은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의 싸움. 남들이 똑같은 도구를 써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질문의 깊이와 연결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 그래서 앞으로는 ‘정답을 얼마나 잘 맞히느냐’가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잘 던질 수 있느냐’가 진짜 경쟁력일지도 모르겠다.
ㅤ
Anthropic's CPO on what comes next | Mike Krieger (co-founder of Instagram)
Mike는 제품 전략이나 가설을 먼저 글로 정리하고 그걸 Claude한테 던진다. Claude가 예상 못한 각도에서 피드백을 주니까, 내 생각을 검증하고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다. 혼자 고민할 때보다 루프가 훨씬 빨라진다.
이제 개발에서 진짜 병목은 코드 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는 과정”이랑 “코드를 실제 서비스에 반영하는 과정” 두 가지다. 방향성과 실행력이 훨씬 더 중요해진 셈.
모델의 한계까지 밀어붙인다는 건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멈추지 않고, 모델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끝까지 실험해보는 거다. 실패해도 괜찮으니 계속 시도하면서 한계를 깨닫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준비해두는 자세.
호기심, 과학적 사고, 독립적 사고, 이 세 가지가 AI 시대에 더 중요해졌다. 내가 먼저 생각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걸 AI에게 물어보면서 검증-배움-업데이트 루프를 계속 돌려야 한다. AI랑 같이 일하면 이 루프가 훨씬 빨라진다.
세 가지 무기:
깊은 도메인 전문성: 특정 분야에 대해 남들보다 훨씬 깊게 파고드는 것
차별화된 고객 접근 방식: 특정 고객군의 문제와 니즈를 집요하게 파악해서 맞춤형 솔루션 제공
대기업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인터랙션 방식: 완전히 새로운 UX나 워크플로우를 빠르게 실험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민첩함
ㅤ
Essential reading for product builders—part 1
창작의 격차라는 표현을 읽고 완전 공감했다.
디스콰이엇을 만드는 3년 동안 수많은 제품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Taste는 높아졌는데, 정작 그걸 내가 직접 만드려니 엄청난 Gap이 느껴졌다.
이거에 종종 답답함을 느끼면서 하던 프로젝트를 금방 접기도 했었고. 근데 Gemini Pro + Claude Code 덕분에 이 답답함이 많이 해소됐다. 공부량을 미친듯이 높일 수 있고, 효율적이면서, 배운걸 정말 많이 실무에 적용하면서 Trial and error를 엄청나게 할 수 있기 때문. 덕분에 점점 Creative Gap이 메워지고 있음을 조금씩 느끼는 중
“읽었다고 말하고 싶음”
-> 이게 가장 피해야할 요소. 읽고 나서 음 맞는 말이네 정도에서 그치면 안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왜?를 의도적으로 떠올려야하며, 최대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프로젝트에 적용해야한다. 아무 행동도 안할거면 애초에 안 읽는게 나음원래 사람들은 10점 1개, 5점 3개보다 9점 1개만 있는걸 더 높게 평가한다. 한가지가 좋아도 나머지가 별로면 평균적으로 별로라고 느끼기 때문임. 정말 훌륭한 것에 집중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작게 됨. 그래야 퀄리티가 유지되니까.
ㅤ
To build trust in complexity, offer small choices and fast feedback
복잡한 서비스일수록 사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선택지와 빠른 피드백이 신뢰와 통제감을 만든다
과정 전체를 미리 보여주고, 한 단계씩 직접 확인하게 해주면 불안이 줄어든다
각 단계에서 바로바로 피드백(예: 초록불)이 들어오면, 과정에 대한 이해와 안도감이 커진다
AI나 자동화도 처음엔 중간중간 설명과 선택지를 주면 신뢰가 쌓이고, 익숙해지면 자동화 비중을 늘릴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만 주는 서비스는 오히려 불안과 무력감을 줄 수 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자주 소통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신뢰가 쌓인다
ㅤ
A quick product simplicity test: remove all the explainers
제품에 온보딩을 좋게하고 설명 문구를 더 적고, 토스트 더 잘 띄워주고, 가이드 넣어주고 등등.. 이런거 하기전에 "아무런 설명 없이도 유저가 잘 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글이다.
나도 뭐 쓸 때 문서 읽고 튜토리얼 해야되고 이러면 급 귀찮아지고, 그냥 일단 막 써보는 타입이다. 뭔가 안내가 많을 수록 더 정신이 없어서 뭘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설명서가 디테일하고 많은 것보단, 그냥 제품의 구조 그 자체로써 친절한 UX를 가짐으로써 설명이 필요없을 만큼 직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명은 그저 임시방편이다.
ㅤ
Will people enjoy AI art?
예술은 내 마음속 감정, 가치, 욕망 같은 것들을 아름다움으로 승화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예전에는 예술적 표현을 위해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 오랜 훈련이 필요했지만, AI 덕분에 누구나 자신의 내면을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술의 민주화가 진행 중이다.
진정성은 얼마나 오래,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담으려 했고, 그게 얼마나 솔직하게 드러났는지에 달려 있다. 인간이 오랜 시간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도 진정성을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AI가 1초 만에 만든 작품과 인간이 일주일간 고생해서 만든 작품이 있다고 해도, 진정성의 차이는 시간이나 노력의 양이 아니라 창작자의 의도와 감정, 그리고 그게 얼마나 솔직하게 드러났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예술에서 솔직함을 드러내는 방법은 자기 경험과 감정에 충실하기, 꾸밈없이 표현하기, 자기만의 언어와 방식 찾기, 의도와 맥락을 숨기지 않기, 관객과 진짜로 소통하려는 시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결국 중요한 건, ‘진짜 마음’이 작품에 담겨서 관객에게 전달되는지, 그 솔직함이 느껴지는지라고 생각한다.
ㅤ
3) World Building
Ep.1: The pioneers of computer graphics 1960-1970
ㅤ
Genie 3, GameCraft 같은 World 생성 모델들
Genie 3는 진짜 게임/미디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기술. 3D는 모델, 텍스처, 라이팅, 엔진 등 여러 프로세스의 순차적인 조립이었는데, 이제는 AI가 ‘다음 프레임의 픽셀’만 예측해서 실시간으로 세계를 만들어냄
근데 현실적인 의문이 생긴다. 예를 들어, 저렇게 생성된 세계에서 내가 아이템을 얻고, 그걸 인벤토리에 넣고, 다른 맵이나 게임으로 옮긴다? 당장은 불가능하다. 내부적으로 메시, 텍스처, PBR 정보가 남지 않으니 “픽셀로만 존재하는 것”을 다른 세션에 넘기는 건 구조적으로 안 맞다.
아직은 Genie 3의 해상도, 물리 법칙, 텍스트 처리 등 여러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GLB, PBR 텍스처 같은 전통적인 3D 에셋 포맷이 단기간 내에 대체될 일은 없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Genie 3 같은 월드모델과 전통적인 3D 파이프라인이 하이브리드로 섞여가지 않을지? “즉석에서 변하는 배경/이벤트/합성 데이터”는 AI가 만들고, 핵심 자산(캐릭터, 아이템, UI 등)은 여전히 PBR 기반으로 관리하는 구조. 실시간 AI 생성과 전통 자산이 목적에 따라 분업되는 그림.
결국 “월드 생성 모델이 모든 걸 대체한다”보다는 “AI가 기존 파이프라인에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한다”는 게 진짜 혁신 포인트라고 봄.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고, 오히려 기존 방식과 섞이면서 새로운 워크플로와 창작 가능성을 여는 중간지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보임
ㅤ
Demis Hassabis: Future of AI, Simulating Reality, Physics and Video Games | Lex Fridman Podcast #475
문명 4~6을 1000시간 넘게 하면서 배운 게 많다. 도시, 군사, 과학, 정책, 외교 등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번의 판 안에서 수십, 수백 번의 피봇과 의사결정을 반복하다 보면, 질 것 같던 초대형맵 신 난이도 게임에서도 역전승이 가능해진다. 전략적 사고는 물론이고, 몇 시간에서 일주일씩 한 판에 몰입하다 보면 감정 롤러코스터도 자연스럽게 컨트롤하며 익숙해진다. 게임 속에서 공작과 이이제이, 배신과 동맹, 이런 경험을 통해 인간 사회의 다양한 패턴도 간접적으로 체득했다. 실제 세상에서 이런 걸 경험하려면 타임머신이 필요할뿐더러, 과거로 간다고 해도 왕이나 위대한 과학자, 정치가가 될 확률은 매우 낮으니 게임이야말로 최고의 시뮬레이터였다.
하지만 결국 문명도 정해진 룰, 정해진 시스템, 정해진 승리 조건 안에서만 움직인다. 아무리 복잡하다고 해도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수많은 게임이 동시에 돌아가는 곳이다.
그래서 AGI와 게임이 만나는 지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다. AI가 현실의 복잡계적 요소를 훨씬 더 정교하게 구현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런 복잡계가 구현된 오픈월드/시뮬레이션에서라면, 과거의 나처럼 한정된 경험만이 아니라 훨씬 다양한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수많은 시나리오와 선택을 반복 체험할 수 있을 거다. 이게 진짜 ‘사회적 시뮬레이터’의 미래 아닐까 싶다.
ㅤ
Civilization on the electronic frontier
II. 사고는 자유를 원한다
바로우를 The WELL로 이끈 이는 『Whole Earth Catalog』의 창립자 스튜어트 브랜디였다. 그는 1984년 해커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한편으로 정보는 비싸고 싶어 한다. 제대로 된 정보는 인생을 바꾼다. 다른 한편으로 정보는 자유롭고 싶어 한다. 배포 비용이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있다.”
우리는 40년 동안 이 긴장을 다뤄 왔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다. 온라인 정보 환경은 소수의 소셜미디어 기업이 지배하게 되었고, 그들은 거대한 연결망을 만들었으나 주의(Attention) 중심 비즈니스 모델 위에 세워졌다. 정보는 자유로워졌지만, 사고는 감금되었다. 우리는 도서관이 아닌 카지노에 가고, 도파민을 소마처럼 소비한다.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해 우리의 정보 활용 방식을 은하계 수준으로 바꿔 놓고 있다. 거의 누구나 옛 신들이 상상하지 못한 인지적 힘을 손에 넣고 있다. 인지 비용이 0을 향해 떨어지면서 인터넷은 말 그대로 ‘생각의 홍수’ 상태가 되었다. 사고도 자유를 원한다.
그렇지만 정보 과잉이 인간적 소통을 왜곡했듯, 사고 과잉은 **‘진짜 사람의 생각’**에 프리미엄을 붙인다. 우리는 생각의 반대편에 사람이 있음을 알고 싶어 한다. 로봇이 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에이전시를 가질 수 있다.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사고를 주고받는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인류의 최종 수호자다.
Substack은 이런 인지적 자유를 위한 도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문화에 관심을 가진 마음들이 만난다. Positive-sum 모델을 통해 커뮤니티를 강화한다. 다시 생각할 힘, 주의를 되찾을 힘, 마음을 되찾을 힘을 제공한다.
ㅤ
ㅤ
coffee chat: https://cal.com/kwondoeon/casual-c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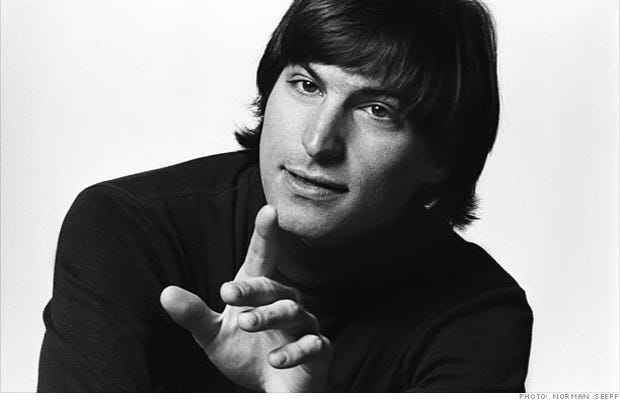





밀도높은 글 잘 읽었습니다
it s goood